knock, knock, knocking_
knoking on heaven's door(노킹 온 헤븐스 도어)라는 곡을 처음 들은 건, 고등학생시절이었던 무렵의 어느날 Avril lavin이라는 가수의 앨범을 듣던 중이었다. 당시의 에이브릴 라빈이라는 외국가수는 당대 최고의 인기를 누르며 자국 뿐 아니라 이 작고 먼나라인 대한민국에까지 적잖은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그리고 나 또한 외국의 그러한 문화를 접하겠다며 음악을 주워들었고, 그러던 와중에 참 우연찮게도 가사가 귀에 들어와버린 것이다. 그렇게 노킹 온 헤븐스 도어라는 타이틀은 나에게는 영화보다 음악이 먼저였고, 그 음악조차 원곡이 아닌 다른 가수가 다시 부른 곡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것이었던 것이었다.
영화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 영화를 언제 어떻게 알게되었고, 어떠한 상황에서 보게 되었는지에 대해 기술하기 되는 경우가 많다. 이건 영화뿐만이 아니라 음악에서도 마찬가지다. 그 영화를 봤던 순간들이 마치 주마등처럼 스치며 그 시절을 다시 떠올리게끔 한다. 물론 가끔은 생각나지 않았으면 하는 기억들도 동시에 떠오르기 때문에 다소 난감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기억이나 추억은 좋은것이라 여기며 그저 떠오르면 떠오르는대로 내버려 두는 편이 오히려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잘 써내려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다.
각설하고, 이 영화는 타이틀부터가 보고싶게 만들어졌다. '하늘(천국)의 문을 두드리다.'라는 의미의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두 명의 주인공은 정말 '천국'으로 가기 위한 여러 액션(?)들을 선사한다. 당장 오늘 밤에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들이었기에, 내일의 태양이 떠오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볼 수 있다는 확신을 할 수 없는 그들이었기에 그들의 일탈은 아주 평범한 내가 보이엔 굉장히 굉장하고 대단히 대단해 보였다.
이미 죽어가고 있는 몸에 독한 알콜을 밀어넣고, 차주인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일단 키 꽂힌 차를 훔쳐 병원을 탈출하는 장면에서부터 이 영화의 희열은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일탈은,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평범한 일탈이 아니었다.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기에 그만큼 더 애절했고, 죽기 전에 해야 하는 (혹은 봐야하는)것들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컸는지를 표현하는 가장 극단적인 표현이었다. 태어나서 바다를 단 한번도 본 적이 없다는 말에 무작장 차를 훔쳐 달아나기 시작한 그들은, 옷과 돈을 훔치기에 이르렀고 흡사 방탕해 보이는 행동까지 저질렀지만 그 모습에서 악(惡)은 찾아볼 수 없었다. 훔치는 건 분명 나쁜 일이지만, 아픈 사람이라고 해서 쉬이 용서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들의 눈빛이나 모습을 보며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렇게 하는게 맞는거야.'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 그들이 표현했던 캐릭터의 진정성이 얼마나 깊다는걸까.
죽을 날을 받아놓은채로 비참한 일생을 마무리하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주제의 영화들은 이 영화 말고도 많을 것이다. 불치병에 걸렸다던가, 피치 못할 사고로 인해 불구가 되었다던가, 가족이 없다던가 하는 식으로 말이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러한 것들이 스토리를 끌어가는 '요소'가 될 뿐, 주제에 다다르지는 못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영화는 다르다. 그들 앞에 주어진 얼마 남지 않은 생의 시간이, 그들의 일탈이, 그들의 죽음이, 그들의 아픔이, 고스란히 주제가 되고 이야기가 되고 영화가 되었다. 그리고 나는 그 속에서 슬픔보다는 환희와 희열을 더 많이 느꼈던 것 같다.
사실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 '바다를 보는 것'이었다. 그리고 영화 속에서 보여지는 그 수 많은 이야기들은 단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에피소드정도로만 여겨진다. 각각의 행동마다 의미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실상 그것보다는 결과에 더 큰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구조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바다를 보게 되었고, 바다를 보여주게 되었다. 예전에 국내의 한 음료 광고에서 '나는 너를 꿈꾸고, 너는 바다를 꿈꾼다.'라는 카피가 나온 적이 있었다. 개인적으로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과 이 카피가 너무나도 잘 어울린다고 생각한다. 남녀의 불같은 사랑 혹은 가슴아픈 짝사랑 이런 류의 개념은 아니지만, 목적은 미묘하게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서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그 느낌이 참 좋았던 것 같다.
삶은 유한하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순간 순간에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살기를 원한다. 그렇다고 누구나 잘 살게 되는 것은 아니고, 건강하게 살다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겠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운명'이다. 그들은 그래야만 하는 운명의 굴레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게 전부였다. 우리도 가끔은 이렇게 간단하고 단순하게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지나온 날에 대해 후회하고 마음 아파하고 신경쓰며 사는 것 보다는,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늦은 후회보다는 이른 행동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데 유익할테니 말이다.
'>> in my life > 영화'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혹성탈출 : 반격의 서막] 인간과 유인원, 진정한 평화는 언제쯤 찾아올까? (0) | 2014.07.15 |
|---|---|
| [트랜스포머:사라진 시대] 사라진 시대가 공룡이 살던 그 시대? (0) | 2014.07.08 |
| [하이힐] 그와 그녀 (0) | 2014.06.24 |
| [우는남자] 울지 못하는 남자와 울 수 없는 남자 (0) | 2014.06.16 |
| [엣지 오브 투모로우] 오늘과 내일의 경계선을 살다 (0) | 2014.06.0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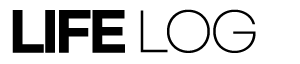







댓글